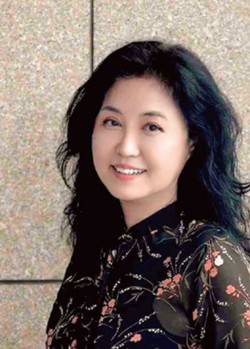
베란다 화단에 이름 모를 싹이 자주 돋아난다. 설란 화분에도 그런 풀이 자라고 있었다. 잎새를 보아하니 난초 못지않게 참해서 선뜻 뽑아낼 수 없었다. 너도 참하게 자라 보라며 빈 화분에 옮겨 심었다.
설란 속에서 떡하니 더부살이하던 새싹은 타래난초였다. 마디게 자라던 타래난초가 제 키보다 긴 꽃대를 올렸다. 보기에는 작고 여리나 자세는 꼿꼿하고 의연하다. 그 자태를 찬찬히 보려면 경배하듯 몸을 낮추어야 한다. 타래난초가 후대를 남기는 비법이 절묘하다. 단단히 받쳐 든 이파리 속에 줄기를 세워놓고 긴 나선형으로 돌려가며 매듭 모양으로 꽃을 단다. 꽃봉오리가 서로 겹치지 않으니 골고루 볕을 볼 수 있어 충실한 결실이 기대된다.
우연히 본 식물이 아득한 기억 한 조각을 꺼낸다. 예전에는 바느질하려면 타래실을 풀어서 썼다. 실 감기는 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낸 어머니가 실타래를 무릎에 끼려고 하면 얼른 다가가 마주 보고 앉았다. 두 손목에 무명실 타래가 걸쳐지면 행여 놓칠세라 팽팽해지도록 힘을 주었다. 긴 곡선이 휘휘 팔자를 그리며 풀려나가는 실을 보면 최면 같은 졸음이 쏟아져 내렸다.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머니의 초승달 된 눈과 마주쳤다.
삶은 홀로 실 감기와 같다. 돌아오는 길 없는 생의 종착까지 타래실을 풀어내어 실패로 감아내듯 살아내야 한다. 실이 엉키듯 갑갑해지면 무릎을 곧추세워 안고 얼굴을 묻는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 무릎이 틀이 되고 두 손이 실감개가 되어 인생 타래를 풀어간다. 어머니가 실타래가 헝클어질라치면 치감고, 끊어지면 맞매듭 지어 감는 것처럼 나아가는 길이다.
아침에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리고 그때쯤이면 풀 먹인 이불 홑청도 사각거렸다. 그루잠을 떨치고 일어나면 바느질된 옷과 뒤꿈치 꿰맨 식구들 양말이 윗목에 놓여 있었다. 날이 새기도 전에 가마솥에 식구들 씻을 물을 데워놓고 대가족 아침 밥상을 차려내던 어머니는 언제 잠을 잤을까.
함 질빵이 기저귀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세 갈래로 땋아진 질빵을 풀어두었다가 시집가는 딸의 짐 속에 넣어주었다. 첫 아이 기저귀에는 나의 굼뜬 바느질의 땀 수만큼 정성이 들어갔다. 신부가 입을 옷감, 신혼 첫날 덮을 이불을 지을 천, 혼서지 등등을 넣은 함을 받던 날의 기억이 새롭다. 혼인의 약속은 자식을 낳고 키우며 집안을 돌보는 책임으로 이어졌다.
나는 살림살이가 어설펐다. 누구를 닮아서 손이 느린지 모를 일이다. 손 빠른 어머니는 그런 나를 두고 전생에 일한 적 없이 살아서 그렇다며 탓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이 없는 편이어서인지 칭찬도 꾸지람도 없었다. 단 한 번, 돌아가시던 그해에 김장김치는 먹을만하다고 했다. 살림 솜씨는 시간 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내는 문제였다.
가족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다. 약속된 시간 내에 음식을 내놓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미리 장 봐놓은 재료를 꺼내어 급히 다듬지만 앞서는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딸 솜씨는 어머니를 닮는다는데 그것만은 천복이 아닌지 지금껏 만족스럽게 음식을 해내지 못한다. 완성된 반찬을 담고 밥이 지어지는 냄새가 나자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온다.
인근 지역에 자주 소풍 가는 장소가 있다. 오래된 집들이 산허리를 지키고 있어서인지 오름길이 푸근하다. 검색하면 뭐든 알 수 있는 세상에도 숨고 싶었는지 휴일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 타래로 둘러선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비경이 잡념을 떨쳐버리고 키 작은 꽃이 핀 길섶은 포근한 인사를 해준다. 허리 긴 해송이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중 나온 촌로처럼 정겹다. 정자 마루에 널따랗게 돗자리를 펴놓고 아홉 명이 빙 둘러앉으니 꽤 복닥거린다. 언제 이렇게 식구가 불어났나. 남편과 만났던 때가 그저께 같은데 수십 년이 후다닥 지났다. 소나무 사이사이로 아이들 웃음꽃이 만발하니 어머니 목소리를 바람결에라도 듣고 싶어진다.
도시락을 다 꺼내고 마지막으로 보자기를 풀자 밥솥 들고 소풍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다들 한바탕 웃음보가 터진다. 그야말로 밥솥이 소풍 따라 나온 날이다. 솥째 들고 온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머니가 평생 그랬듯이 가족들에게 더운 김 오르는 밥을 먹이고 싶어서였다.
딸들이 실타래 풀듯이 느짓느짓하게 소풍 상을 차리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안 좋은 점도 닮는다더니 하필이면 어미 느린 손을 닮았다. 젊은 시절에 나도 듣지 않던 잔소리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니 기다려 줄 일이다. 기다리다 허기진 눈들이 주걱으로 몰려든다. 점심을 먹는 동안 난데없이 무지개가 뜨고 희미한 달이 누워있다. 참 신기하지, 여러 색깔 타래실이 '그때도 그랬지' 하는 것 같다.

언제부턴가 소소한 일에도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할머니가 내려다보는 유년의 뜰에, 숱 많은 머리를 갈라가며 타래타래 땋아주는 어머니 치마폭에 내가 앉아있다. 할머니가 집안을 아우르는 타래난초 줄기라면 어머니는 부지런한 꽃줄기였다. 그 안정한 줄기 속에 피어나던 우리….
딸네 가족과 헤어지고 집안에 단둘이 들어선다. 품에 안고 토닥토닥 재워야 잠들던 두 딸이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다. 어서 갔으면 했던 세월 한 뭉치를 타래타래 풀어놓고 보니 허전함이 밀려온다. 내가 갓난쟁이 첫딸 업고 친정에 다녀오던 날 어머니 마음이 이랬나.
베란다를 내다보니 타래난초가 꽃을 더 달아 놓았다. 꽃을 총총히 달고도 곧게 설 수 있는 것은 줄기의 힘이리라. 사는 일이 다 그러겠으나 어머니가 된 여자는 자식에게 변치 않는 중심이다. 어머니가 그랬고 나도 그랬듯이 딸들도 생의 타래를 풀어내어 단단히 감을 것이다.
참 중한 삶, 툭 치고 지나는 바람에 흔들리던 타래난초가 자세를 다잡고 있다.
성혜경 작가는 2017년 <수필과 비평>을 통해 등단했다. 현재 김해수필협회 회장과 김해문인협회 편집장을 맡고 있다.
